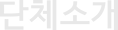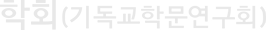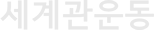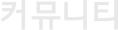| 제목 |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종교 실천을 통한 초국적 돌봄 네트워크 형성:한 선교사의 생애사 연구 |
| 영문 제목 |
The Formation of a Transnational Care Network through Religious Practice among the Koryo-saram Diaspora: A Missionary's Life History Study |
| 저자 |
손지혜 (Jihye Son) (선문대학교 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
| 다운로드 |
 5.손지혜_123-147.pdf
(2.28 MB)
5.손지혜_123-147.pdf
(2.28 MB)
|
| 논문 구분 |
일반논문 |
세계관기초 |
| 발행 기관 |
신앙과 학문 (ISSN 1226-9425) |
| 발행 정보 |
제30권 3호 (통권 104호) |
| 발행 년월 |
2025년 09월 |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한 한국인 선교사의 생애사를 통해 고려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종교적 실천이 어떻게 초국적 돌봄 네트워크로 기능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선교사의 생애를 전환기, 소명, 해외 사역, 전쟁기 위기 대응, 국내 정착 지원의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종교적 실천과 정체성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 선교사는 외부자이자 내부자인 경계적 주체로서, 교단의 제도적 파송이라는 상징자본과 공동체 내부의 신뢰라는 관계자본을 결합하며 활동하였다. 또한 종교 공동체는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 구호, 피난 지원, 정착 보증금 마련, 아동 돌봄 등 사회적 실천을 수행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였다.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종교적 네트워크는 초국적 돌봄 연대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종교가 국가와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민종교 연구가 주로 ‘이주민 신자’에 집중해온 한계를 넘어, 비이주자인 선교사의 경계적 위치성과 종교 공동체의 사회적 실천을 조명함으로써 학문적 기여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 사회의 다문화·난민 정책에 있어 종교 공동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성을 시사한다.
|
| 영문 초록 |
This study examines how religious practice functions as a transnational care network within the Koryo-saram diaspora community through the life history of a Korean missionary. The missionary’s trajectory is analyzed across several phases: early life transitions, vocational calling, overseas mission, crisis response during the Russia–Ukraine war, and settlement support in Korea. Findings indicate that the missionary embodied a boundary subjectivity, simultaneously an outsider and insider, by combining institutional capital from denominational commissioning with relational capital of trust built within the community. The religious community emerged not only as a site of worship but also as a social safety net that organized relief, evacuation support, housing funds, and child care. During wartime, religious networks expanded into transnational solidarity, complementing state and institutional gap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migration and religion studies by shifting attention from immigrant believers to non-migrant missionaries, highlighting how boundary subjectivity and religious practice are enacted in diaspora contexts. Furthermore, it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and refugee policies in Korea,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religious communities. |
| 키워드 |
고려인 디아스포라, 고려인 사역, 종교 공동체, 경계적 주체성, 초국적 돌봄 |